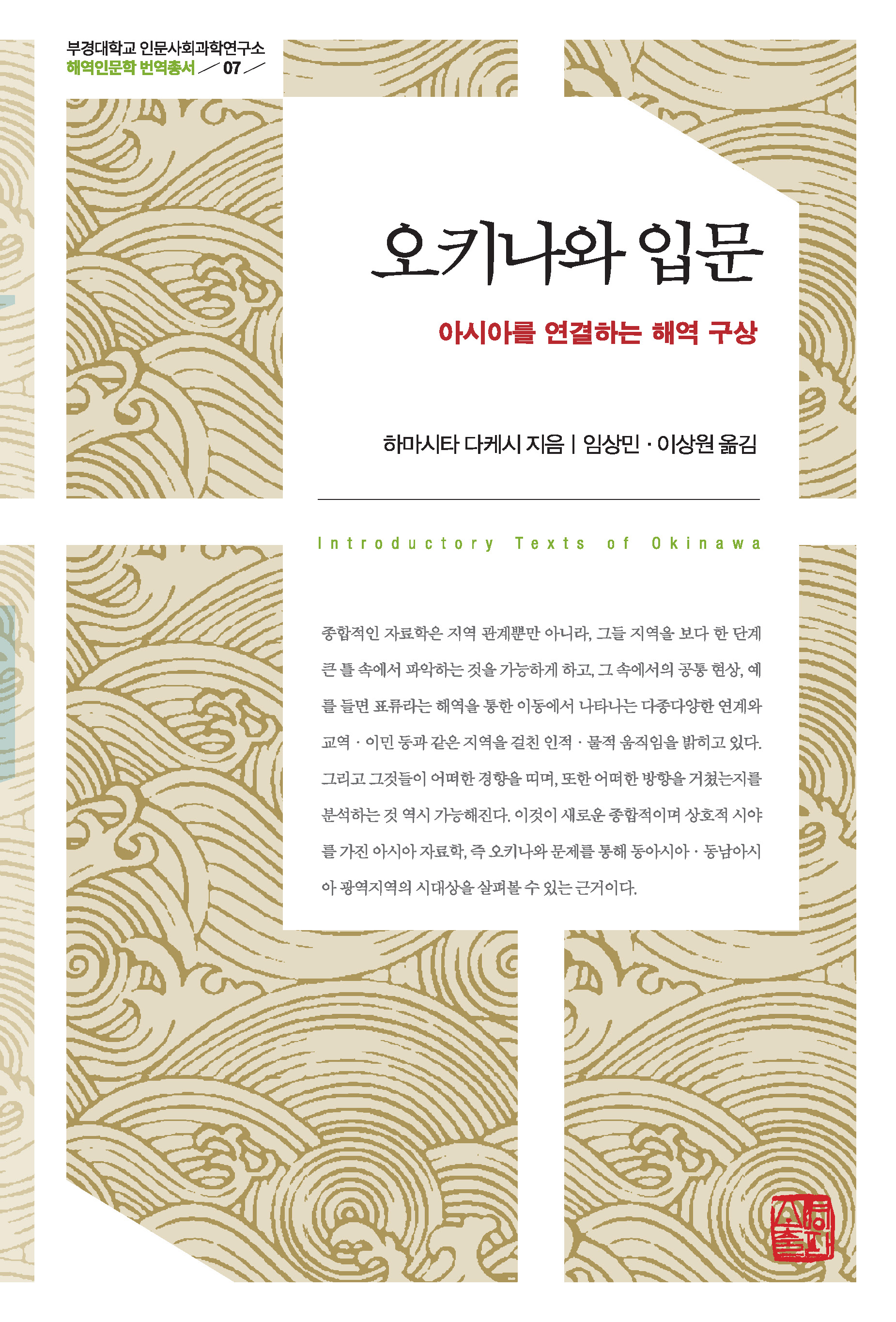출간 도서
도서 상세보기
| 저자 | 하마시타 다케시 | 역자/편자 | 임상민,이상원 역 |
|---|---|---|---|
| 발행일 | 2021.10.30 | ||
| ISBN | 9791159056086 | ||
| 쪽수 | 206 | ||
| 판형 | 신국판 양장 | ||
| 가격 | 22,000원 | ||
상호 교섭적이며 유동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그려내는 하마시타 다케시
근대 이후 전쟁과 상흔으로 굴곡진 오키나와는 우리에게 동질감을 느끼는 대상이다. 그래서인지 오키나와에 대한 연구는 주로 이러한 감각에서 출발하고 있다. 그런데 조공무역체제를 주장해온 하마시타 다케시의 오키나와에 대한 연구는 여기서 비켜서 있다. 그는 오키나와 및 동아시아에 대해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의 틀을 기존의 국민국가 및 육역을 중심으로 형성된 주변으로서의 오키나와가 아니라, 류큐왕국 당시의 중국 및 동아시아의 지역과 해역을 둘러싸고 형성된 광역 질서와 그 다이너미즘을 중심으로 사유하는 ‘방법론적 귀화’를 시도하고 있다.
근대 이후, 배타적인 국민국가의 획일적이고 균질화된 주권 아래로 포섭하려는 재해권의 사고가 작동하면서 지역 및 해역은 국가의 하위 개념으로 인식되어 왔고, 그 결과 이들 주변이 가지는 독자성과 이질성은 사유로부터 배제되었다. 오키나와 역시, 일본 편입(1879)과 미군 통치(1945), 그리고 일본 복귀(1972)와 같이 근대 이후의 일미 간의 관계성 속에서 수동적이고 닫힌 공간으로 기술되는 경우가 많은데, 근대 이전의 해역에 집중하면 오히려 기존의 육역 중심의 관점에서는 포착할 수 없었던 역동적인 해역 네트워크가 부상한다. 하마시타 다케시는 지금까지 육역을 중심으로 형성된 사고, 즉 중앙과 지방, 중심과 주변, 종주권과 주권, 남과 북, 개와 폐, 관과 민의 관계를 전복시켜 동아시아ㆍ동남아시아의 해역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상호 교섭적이며 유동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
근대 이전의 해역 네트워크 및 류큐의 지정학적 위치
류큐는 지정학적 측면에서 보면 남중국해 동쪽의 도서부를 따라 필리핀에서 술루에 이르는 교역로와 서쪽 대륙부 연안을 따라서 태국, 말라카로 이어지는 교역로와 연결되어 있고, 이곳을 통해 동아시아ㆍ동남아시아의 중국인계 상인뿐만 아니라 인도 상인, 이슬람 상인, 나아가 유럽 상인도 참가하는 이른바 해역의 연쇄를 확인할 수 있다. 류큐는 명대에 이르기까지 대만과 연결되는 일련의 연쇄 도서로 인식되었고, 동중국해와 남중국해를 둘러싼 중국과의 조공 시스템 속에서 자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후추와 소목을 동남아시아 교역을 통해 입수해서 전해 주는 중계무역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었다.
특히 하마시타 다케시는 15세기부터 기술되어 온 류큐왕조 400여 년에 걸친 외교문서 『역대보안』의 편집 작업에 직접 참여한 경험을 토대로, 중국을 중심으로 한 류큐왕국과 외교관계를 맺은 동아시아 국가들이 조공관계 및 화이이념 하에서 하나의 유기적인 통일체를 이루는 광역지역 네트워크에 주목한다. 그리고 이러한 해역 네트워크는 지금까지 기록에는 존재하지 않는 다양한 인적ㆍ물적 이동의 흔적을 언어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 예를 들면 중국과의 조공관계는 정치적인 관계에 머무르지 않고 인적ㆍ물적 이동이 이루어졌고, 푸저우의 류큐관 및 류큐 구메무라의 ‘민인36성’, 그리고 동남아시아 항구도시에 다수 형성된 중국계 집단의 거류지 등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일본은 메이지 후반에 이민정책을 적극적으로 전개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근대 이전의 오래전부터 해역 네트워크를 따라 교역권과 이민권이 동시에 형성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고의 전환은 일본의 근대와 전후, 그리고 현대를 사유하는 다양한 힌트를 제공한다. 예를 들면 우리들은 일반적으로 근대 이전의 외국과의 교역은 나가사키 한 곳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해역의 관점에 주목하면 나가사키 이외에도 홋카이도 마쓰마에번의 아이누와의 루트, 쓰시마를 통한 조선과 규슈의 중계 루트, 사쓰마에 의한 류큐를 사이에 둔 중국과의 루트 등, 에도막부는 쇄국 하의 대외교역 개항지인 나가사키를 포함해서 총 네 곳의 창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었다.
또한 이러한 근대 이전의 해역 네트워크 및 류큐의 지정학적 위치를 생각하면, 미국이 일본의 개국을 위해 류큐 왕국과 사전에 접촉했다는 사실은 흥미롭다. 즉 동아시아ㆍ동남아시아 해역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작동하고 있었던 조공체제 속에 있었던 류큐, 사쓰마 또는 에도막부 하에 있었던 류큐는 중국과 일본을 연결해 주는 중계지로 인식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류큐ㆍ오키나와’의 관점을 다방면으로 제시하다
하마시타 다케시가 이 책에서 끊임없이 ‘류큐ㆍ오키나와’를 병기하는 이유 역시 여기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역사적으로 해역의 관점에서 바라본 류큐 지역이 가지는 동아시아 역내 시스템의 다층적인 질서 관계 및 교섭 관계를 새롭게 상기함으로써, 중앙과 지방이 아닌 지구화와 지역화의 관계성 속에서 오키나와의 또 다른 다원성과 다양성, 그리고 포섭성을 가진 개방적인 다문화 시스템의 사유 가능성을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