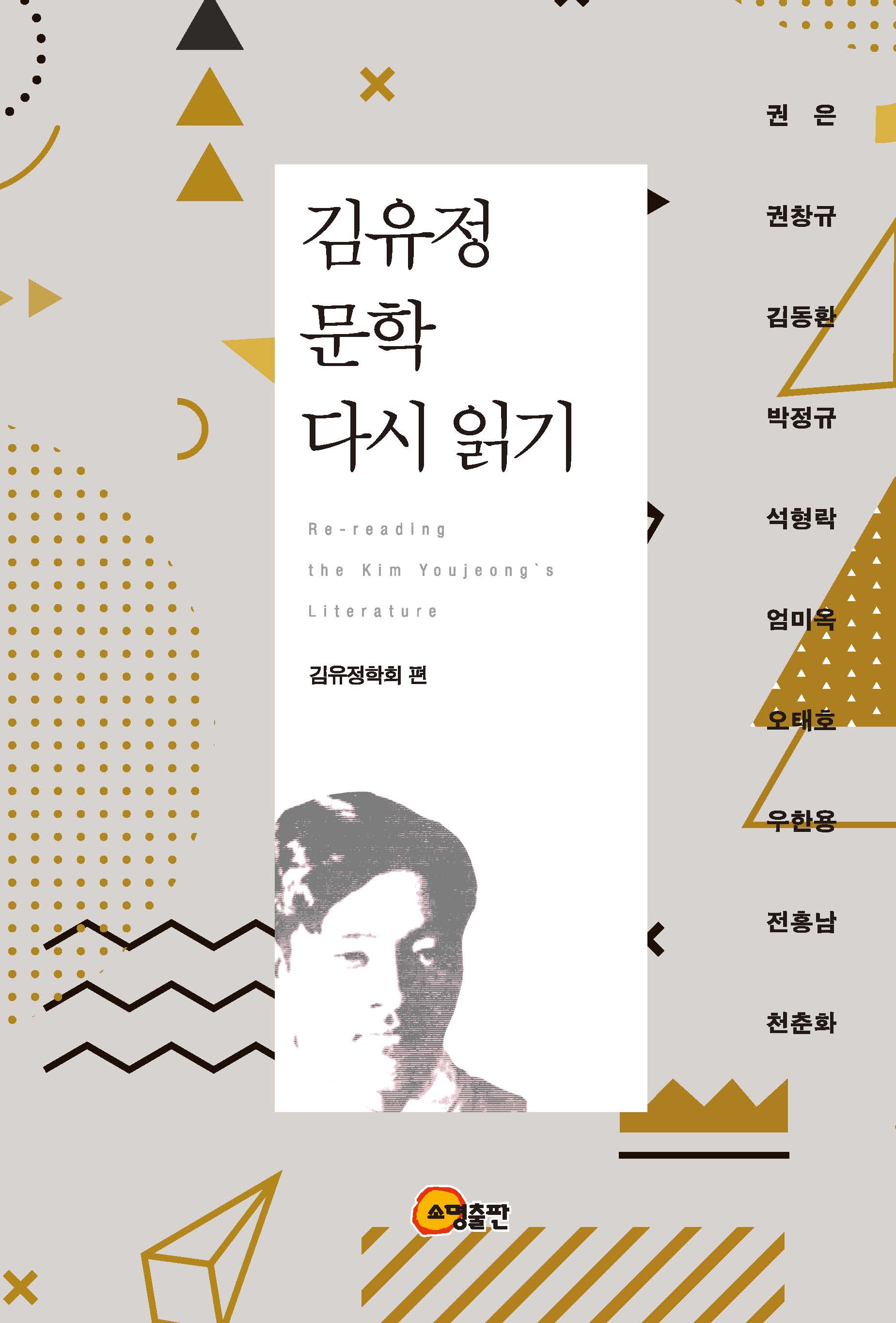출간 도서
도서 상세보기
| 저자 | 권은, 권창규, 김동환, 박정규, 석형락, 엄미옥, 오태호, 우한용, 전흥남, 천춘화 | 역자/편자 | 김유정학회 |
|---|---|---|---|
| 발행일 | 2019.3.25 | ||
| ISBN | 9791159054013 | ||
| 쪽수 | 325 | ||
| 판형 | 신국판 양장 | ||
| 가격 | 25,000원 | ||
김유정, 시대를 넘어
김유정 문학이 도래한 지 80년이 지났지만 그의 작품들은 여전히 활발하게 읽히고 있다. 김유정은 중등학교 국어 및 문학 교과서에서 작품이 다수 수록되는 작가 중 하나이며 그의 여러 작품이 영화, 연극, 애니메이션 등으로 만들어져 새롭게 향유되고 있다. 이러한 거듭된 읽기를 통해 김유정 문학의 가치와 감동은 새롭고 풍요롭게 다가온다. 김유정학회는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연구 성과와 창작물을 엮어 꾸준히 책으로 펴내고 있다. 이번 단행본은『김유정의 귀환』(2012),『김유정과의 만남』(2013),『김유정과의 산책』(2014),『김유정과의 향연』(2015),『김유정의 문학광장』(2016),『김유정의 문학산맥』(2017),『김유정 문학의 감정 미학』(2018)에 이은 여덟 번째 성과이다. 이번 단행본에는 열 편의 글이 실려 있다. 그중 여덟 편은 연구 논문이며 두 편은 김유정의 삶과 문학에서 모티프를 얻어 창작된 소설이다.
지금, 여기서의 독해법
『김유정 문학 다시 읽기』에서는 주제에 맞추어 가능한 한 다양한 방식과 관점에서 김유정 소설을 독해하고자 시도했다. 「식민지 도시 경성과 김유정의 언어 감각」(권은)에서는 김유정 소설의 배경에 주목하여, ‘강원도’로 대표되던 김유정 소설에서 그 못지않게 ‘경성’이 장소적으로 중요하였음을 밝히고 이를 통해 김유정의 언어적 특성을 파악한다. 「농민의 일탈을 둘러싼 화폐 권력과 식민지자본주의」(권창규)에서는 김유정 소설에 드러난 농민의 일탈과 비극, 특히 도박, 도둑질, 사기, 투기 행위 등을 둘러싼 식민지자본주의화 과정을 논의 중심에 둔다. 「지배적 비평 용어와 김유정 문학」(김동환)에서는 김유정 문학을 논할 때 거의 필수적으로 거론되는 용어들의 유래를 살펴보며 김유정 문학 연구를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총 286편의 논문을 분석하고 이를 21개의 핵심어 범주로 나누어 분류하여 분석함으로써 김유정 연구의 확장을 도모하였다. 「김유정 소설에 나타난 ‘연민의 서사’」(오태호)에서는 김유정 소설이 지닌 ‘연민의 서사’에 대해 ‘들병이, 연정, 물욕, 궁핍’ 등의 제재로 세분화하여 분석한다. 「김유정 소설의 폭력의 기억과 서사적 재현」(천춘화)에서는 김유정의 소설에 나타난 폭력에 주목한다. 김유정 작품 속에서 서술자는 폭력의 가해자, 피해자, 관찰자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접근하고 있음과 동시에 그 입장들을 리얼하게 재현해내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그의 트라우마 기억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밝힌다. 이를 통해 김유정에게 트라우마가 있었다는 사실보다는 김유정의 문학은 감당하기 어려운 정서적 고통 위에 세워진 상처의 보루였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1930년대 후반 작고 작가 애도문의 서술 양상과 그 의미」(석형락)에서는 1930년대 후반 특히 김유정과 이상을 대상으로 한 애도문의 서술 양상과 그 의미를 밝히고 있다. 애도문은 정치적, 문화적으로 억압적인 사회에서 사회적 발언의 창구 역할을 담당했으며, 작가론, 문학론, 회고록, 반성문, 고백록, 편지글, 공개장, 전, 소설이 되기도 했다. 이는 고인의 삶과 문학을 일반에 알리려는 애도 주체의 의지를 반영하면서, 결과적으로 애도문이라는 글쓰기의 장르적 확장성을 보여주었다고 논증한다. 「「봄봄」의 OSMU와 스토리텔링 양상」(엄미옥)에서는 김유정의 단편소설 「봄ㆍ봄」을 대상으로 작품이 하나의 원소스이자 원형콘텐츠로서 OSMU(One source Multi use)되어 온 과정을 살폈다. 소설 「봄ㆍ봄」과 영화 <봄봄>, TV문학관 <봄봄>, HDTV문학관 <봄, 봄봄>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영화와 드라마는 소설을 활용하면서도 매체와 장르의 특성에 적합한 스토리텔링 전략으로 새로운 서술과 의미를 생산하였다고 평가한다. 「김유정 소설의 문학치료학 적용 가능성 고찰」(전흥남)에서는 최근 문학치료학의 대두와 함께 문학치료학 텍스트로서의 김유정 소설의 적용 가능성을 탐색한다. 특히 김유정의 소설에 나타난 웃음의 기제와 담론을 통해 문학텍스트로서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 대상으로 삼는다. 이 외에도 이 책에서는 김유정에 그 영감을 기원한 소설 두 편을 실어 작가 김유정이 지금도 우리 문학에 영감을 주며 끊임없는 자극이 될 수 있음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