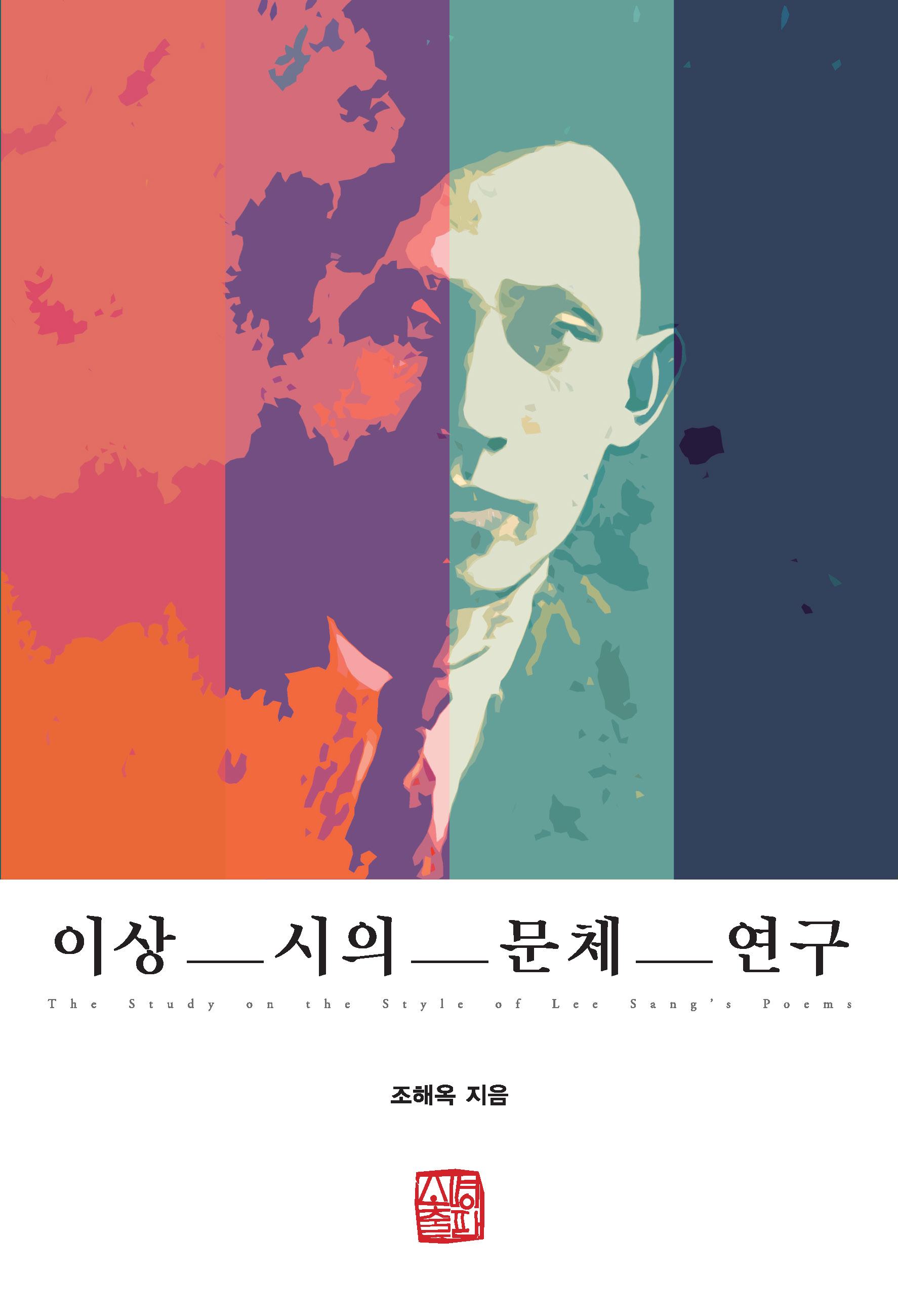출간 도서
도서 상세보기
| 저자 | 조해옥 | 역자/편자 | |
|---|---|---|---|
| 발행일 | 2023-11-20 | ||
| ISBN | 979-11-5905-848-6 | ||
| 쪽수 | 220 | ||
| 판형 | 152*223, 무선 | ||
| 가격 | 18,000원 | ||
생활언어가 생성해내는 시의 문체
저자는 국어학적 접근을 통해 이상 시 문체적 특성을 살피고, 문체로 나타나는 시 의식을 고찰한다. 또한 이상 시 텍스트에 실현된 한자어, 보조용언, 서울 방언 등을 통해 이상 시 연구의 외연을 확장하고자 한다. 이 책에서는 주제론과 의미론으로 이상 시를 해석하는 경향에서 벗어나 시가 문헌 속에만 존재하는 추상적인 문자가 아니라, 시인의 보편적이고 개인적인 언어습관이 반영된 구체적 실현체라는 인식이 나타나 있다.
이상의 문체를 통해 시 의식을 밝히다
제1장과 제2장은 이상의 국문시에 쓰인 한자 어휘들의 특징을 분석함으로써 이상의 언어의식을 규명한다. 이상 시에서 한자어 조어들은 시적 자아의 의식을 응집시키는 효과를 창조하며, 이상의 독창적인 시 의식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파악한다. 이상의 국문시에 쓰인 한자어들과 『조선 후기 한자 어휘 검색사전-물명고物名考·광재물보廣才物譜』와 『훈몽자회訓蒙字會』를 대조하고, 재래 국어 한자어와 일한자어를 구별하는 작업을 통하여 이상의 시 의식을 규명하고 있다.
제3장은 「위독危篤」 연작시에서 이상의 어감 중시의 언어의식이 나타나고 있으며, 다양한 보조용언의 활용이 이상 시에서 의미를 다채롭게 생성해 내는 요소임을 살핀다. 특히 「위독危篤」 연작시에 쓰인 ‘이자二字 한자어’가 의미를 극대화시키고 명료하게 드러내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수식어구와 수식 대상의 독특한 결합 상태가 이상 시에서 새로운 의미를 창조해 내고 있음을 밝힌다.
제4장은 이상 시의 문체적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상의 국문시에 투영된 서울 방언의 특징과 의의를 규명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함을 역설한다. ‘모음’을 중심으로 이상의 시에 움라우트 현상과 모음상승 등으로 나타난 서울 방언의 특징과 의의를 살피고, 연결어미 ‘-드키’가 이상 시에서 특징적인 서울 방언의 실현임을 밝힌다. 서울방언이라는 생활 언어는 자연스럽게 이상의 시적 언어로 투영되었으며, 그의 언어실험에 있어 하나의 배경이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의 국문시가 지닌 개성적인 시 문체는 이상의 의식적이고 의도적인 언어 실험과 함께 자연스럽게 배태되고 학습된 서울 방언에 의해 형성되었음을 밝힌다.
제5장은 그동안 이상 시 연구에서 다뤄지지 않았던 추정의 보조용언 ‘보다’와 종결의 보조용언 ‘버리다’의 연구를 통해 보조용언의 의미 생성 과정을 확인한다. 이상 시에서 보조용언 ‘버리다’와 ‘보다’가 쓰인 작품들을 중심으로 화자의 내밀한 심리가 강화되어 드러나는 과정을 탐색한다. 이상의 국문시 작품에서 추정의 보조용언 ‘보다’는 화자의 소외감과 직면한 상황에 심리적 거리를 두고자 하는 화자의 심리가 반영되어 있는 반면, 시행의 ‘보다’는 화자가 당면한 상황으로부터 자신을 분리시켜 거리를 두고자 하는 심리를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음이 나타난다. 종결의 보조용언 ‘버리다’는 아쉬움의 의미를 생성하는 경우, 홀가분함의 의미를 생성하는 경우로 나뉜다. 또한 종결의 보조용언 ‘버리다’를 통해 화자는 비가역성의 시간을 드러내기도 한다.
제6장에서는 이상 시 문체 연구 외에도 이상과 동일 방언권에 속한 임화의 시도 함께 다루고 있다. 이상 시와 임화 시에는 서울 방언의 공통된 요소들이 나타나면서 동시에 시인이 지향하는 시 의식에 따라 서울 방언이 상이하게 실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부록〉에 실린 1930년대 문예지 『조선문단』, 『조선문학』, 『문장』에 나타난 서울 방언의 목록 정리에서 서울의 생활언어의 문학화를 짐작할 수 있다.